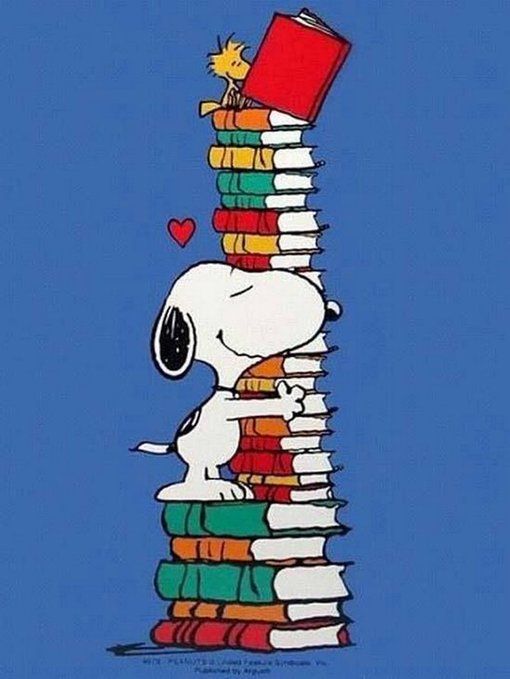책고래 블로그
고양이를 잡아먹은 오리 본문
- 저자
- 김근우
- 출판
- 나무옆의자
- 출판일
- 2015.03.05
<시작>
p.7
불광천에는 오리가 산다.
나는 돈이 없다.
위의 두 가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없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살다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이 한데 얽혀서는 장 꼬이는 것처럼 꼬일 때가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내 인생이 그렇게 꼬였던 시절의 이야기다.
p.119
"진짜 있을까요? 그 오리 말이에요. 영감탱이의 고양이를 잡아먹은 오리."
"있을지도 모르죠. 노인네가 그렇게 열심히 찾는 걸 보면 진짜 있는지도 몰라요. 불광천에 오리가 정말 많잖아요. 그중에 고양이 애호증이 있는 별난 입맛의 오리가 한 마리쯤 있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긴 영감탱이가 살짝 노망기가 든 것 같기는 해도 완전히 맛이 간 건 아니잖아요. 오리 어쩌고 하는 소리만 빼면 제법 논리적이고 머리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고양이도 있긴 있었고요. 고양이 호순이, 그런 고양이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고양이 사진도 보았고, 사료 그릇도 보았고, 꼬마 녀석도 그 사실을 증언했고요. 그러니까 호순이를 잡아먹은 오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고양이가 있었으니 그 고양이를 잡아먹은 오리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조금도 논리적이지 않았다. 고양이와 오리는 서로이 존재를 입증해주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논리를 따져야 할 내 두뇌는 알코올 위에 둥둥 떠서 흔들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거 정말 말 되네요. 고양이가 있었으니 오리도 있을 수 있죠. 오리가 있음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p.145
그 얼마 후에야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가 우리라는 것을. 고양이를 잡아먹은 오리를 쫓는 사람과 그에게 고용된 사람들, 그러니까 너와 나가 결합하여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먼저 깨달았는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었다. 우리는 눈빛만으로 서로의 깨달음을 깨달았다. 깨달음에 깨달음이 더해지자 침묵이 깨졌다.
p.191
이제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진다는 건 지기 싫은데 하는 수 없어 조금씩 아껴가며 진다는 의미였다. 자연의 순리라 어쩔 수 없으면서도 미련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체념과 오기가 뒤섞인 표현이었다. 뉘엿뉘엿 지는 해를 보고 있으려니 나도 아쉽고 너도 아쉽고 우리가 다 아쉽다는, 아무 쓰잘머리 없는 생각이 또 머리를 쳐들었다.
p.218
굳이 따지자면 가짜 호순이를 만들어낼 생각까지 했을 때 이미 배신은 시작되었거나 혹은 가능성만이라도 잉태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건 아무리 잘 봐주어도 가능성일 뿐이었다. 우리는 가짜 호순이를 만들기 전에 진짜 호순이를 최선을 다해서 찾을 생각이었다. 노인이 사랑하는 진짜 호순이를 되찾아주는 건 당연히 배신이 아니었지만, 노인이 증오하는 가짜, 그것도 진자 가짜도 아닌 가짜의 가짜를 만들어주는 건 명백한 배신이었다.
다 노인을 위한 것이라는 핑곗거리가 있기는 했다. 그 핑계에 의지해서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핑계는 약했다. 노인의 눈물 섞인 호소에 비하면 턱없이 약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노인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고, 알고 있는 거라고는 그가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에이해브 선장을 미쳤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따라간 선원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미쳤거나 어쨌거나 그는 선장이었고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우리는 어떤가. 선장을 내버려둔 채 피쿼드호에서 달아나려 하고 있지 않은가. 아예 피쿼드호를 뒤집어서 선장과 함께 바다에 수장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그만둘까. 아들에게 전화해서 역시 그런 사기는 못 치겠다고 할까.
그럴 수도 없었다. 노인이 가짜에 홀린 건 분명했고, 아들의 저의가 무엇이든 그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노인을 구원할 수 있는 최후의 해결책이었다. 방법의 윤리성은 둘째치고 그게 정말 효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가짜의 가짜가 진짜로 작용하는 것이다. 노인이 가짜 오리를 호순이를 잡아먹은 그놈으로 인식하고 놈의 목을 비틀어버린다면, 그렇게 해서 마치내 해피엔드를 거둔다면 가짜의 가짜가 진짜로 작용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논리는 그럴싸했지만 역시 선뜻 전화를 걸 수는 없었다. 우리는 갈팡질팡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우리는 가짜를 쫓는 노인과 가짜의 가짜를 만들려는 아들 사이에, 즉 결코 진짜일 수 없는 가짜와 가짜의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될 수도 있는 가짜 사이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p.260
"고양이도 있고 오리도 있고. 한때는 고양이는 없고 오리만 있었지. 또 어느 땐 고양이는 있는데 오리가 없었고. 근데 이젠 둘 다 내 집에 있어. 그래서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냥 지켜보는 거지. 이 두 녀석이 한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나중에 언제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안달할까. 결국 어느 하나가 사라지고 말까. 알 수 없지. 지켜보는 수밖에.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허망하지만 무슨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안 그러냐?"
p.267
꼬마가 가슴에 손을 척 얹고 무슨 선언이라도 하듯 제 이름을 댔다. 그다음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여자가 무슨 기밀문서라도 펼치듯 자신의 이름을 댔다. 노인의 이름은 이미 알고 있었다. 노인은 얼마 전 집에서 고양이와 오리 사진을 찍다가 불쑥 자기의 이름을 발설했다. 자기 이름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노인은 우스꽝스러운 이유를 갖다 댔다. 난 이름이 있는데 저놈들은 아직 없잖나. 자네들이 쟤들 이름 짓는 걸 도와주었으면 해서.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겠다. 고양이와 오리가 결국 어떤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도. 우리가, 고양이와 오리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제 이름을 갖고 있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끝>
소설이라고는 시시콜콜한 연애소설밖에 읽지 않았었는데, 이제 날도 덥고 남녀가 꽁냥꽁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조금씩 지겨워지면서 신선한 이야기는 없을까 하던 차 만나게 된 소설이다.
'문학 > 한국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인 불장에 읽으면 재밌는 소설 <달까지 가자> 장류진 (0) | 2024.11.14 |
|---|---|
| 충격적 반전 소설 <홍학의 자리> (0) | 2024.08.18 |
| [소설] 아가미 / 구병모 (0) | 2023.04.29 |
| [밑줄] 피구왕 서영 - 황유미 (0) | 2020.12.09 |
| 한 스푼의 시간 - 구병모 (에담) (0) | 2020.09.25 |